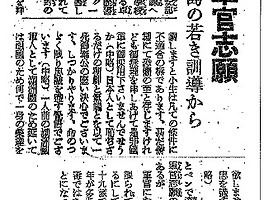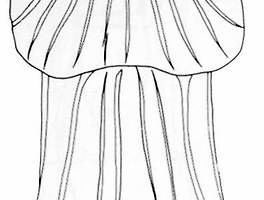1994년 미국 월드컵 자료를 찾다가 ‘경우의 수’를 따진 기사를 검색했다.
스페인(2무)·볼리비아(1무1패)와 비겼던 한국(2무)이 독일(1승1무)과의 예선 최종전을 앞둔 시점이었다. 기사는 독일과의 전력차는 아랑곳 없이 갖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다 ‘일장춘몽’으로 끝을 맺는다.
‘독일이 혹 16강전에서 쉬운 상대를 고르려고 일부러 한국과 비겨서 조 2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즉 독일이 조 2위가 되면 비교적 쉬운 나라들로 구성된 A조 2위(루마니아·미국·스위스 등)와 16강에서 만날 수 있기에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독일은 헛된 기대와 달리 한국을 3-2로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촌스런 기사를 누가 썼나 기자 이름을 보니 어이없게도 ‘이기환 기자’였다.
낯이 화끈거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21년 전에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당대의 기사였다’고 변명해본다.
사실 ‘경우의 수(number of cases·境遇─數)’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짓수’를 말한다. 확률과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의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사실은 개인과 팀의 전력차가 엄연히 나는 스포츠에서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력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진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기자나 해설가나 마찬가지다. 또한 스포츠라는게 워낙 변수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저런 기사를 쓰고 분석을 하다보니 ‘경우의 수’까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애교로 봐주기 바란다. 21년 전에는 그런 기사가 통용됐으니 말이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는 어떤가. 김정남 감독의 인터뷰가 구닥다리다. “최강 팀에게 지더라도 골차를 줄이고, 또 한 팀은 물고 늘어져 비기고, 다른 한 팀은 죽자 살자 덤벼 이기는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아르헨티나와 정면대결, 마라도나는 찰거머리에 걸리면 신경질을 부린다’는 등 잔뜩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1-3으로 완패하자 ‘너무 긴장해서 제실력을 못냈다’고 꼬리를 내렸다.
다음 상대인 ‘불가리아는 수비 허점이 많아 해볼만 하다’고 하더니 결국 1-1. 이탈리아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잔뜩 ‘경우의 수’를 늘어놓으며 ‘한가닥 희망이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2-3패. 이런 기사가 등장한다.
“덴마크는 500만 인구에 등록 선수 18만명인데 한국은 2000명 뿐…. 축구전용구장 하나 없는 현실이….”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지금 보면 필시 낯뜨거워질 것이다.
이후에도 ‘죽음의 조를 만났다’ ‘패했지만 희망은 있다’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았다’ ‘축구 저변이 문제다’는 등의 희망고문이 반복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으로 대부분 사라졌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경우의 수’였다.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칠레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없이 16강에 올랐다.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세상인데 복잡한 계산을 ‘실력’으로 해결해준 어린 친구들이 참 대견하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흔적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구를 위한 혈서(血書)인가 (0) | 2015.10.28 |
|---|---|
| 남근은 아니고…, 신라인의 지문도 있고… (2) | 2015.10.26 |
| 폐암투병 요한 크루이프, '아름답게 이겨주길…' (0) | 2015.10.23 |
| 중국의 화장실 혁명 (0) | 2015.10.19 |
| 역사학자들의 봉기 (4) | 2015.10.14 |